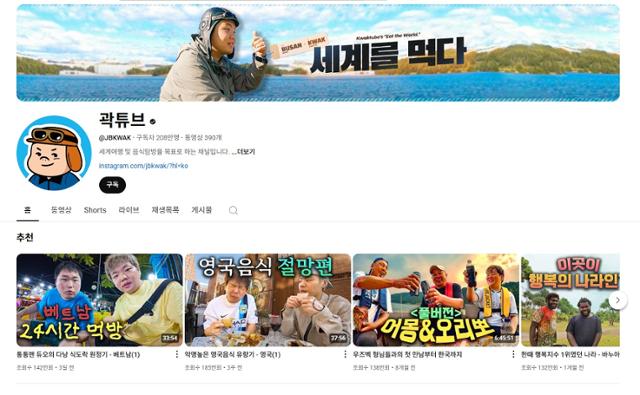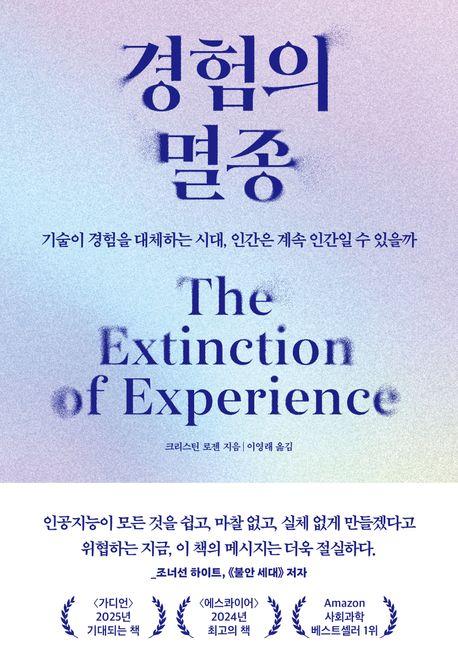[책과 세상]
크리스틴 로젠, '경험의 멸종'
크리스틴 로젠, '경험의 멸종'
부부가 아이를 방치하고 게임에 몰두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국내서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챗GPT 생성 이미지
여행 영상 콘텐츠 전성시대다. 곽튜브, 빠니보틀 같은 1세대 여행 유튜버부터 벌써 시즌4까지 나온 기안84의 '태계일주'까지. 여행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유명 유튜버들은 종종 여행기를 중계하듯 영상으로 남긴다. 여행이란 자못 내 몸으로 겪는 경험인데, 우리는 왜 방구석에서 남의 여행기를 즐겨 보는 걸까.
역사학자인 크리스틴 로젠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신간 '경험의 멸종'에서 "경험의 정의가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경험은 더 이상 물리적 접점을 전제로 하는 '직접 경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같은 기술을 매개로 하는 '간접 경험'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경험이 됐다. 경험은 이제 "겪는 일"에서 "보는 일"로 옮겨 가는 중이다.
경험의 멸종 극단엔 '리액션 영상' 인기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소비하는데 시간을 쏟는다. 내가 몸소 경험하기 보다는 실제 경험을 짧게 엿보기를 선호한다.
직접 경험이 멸종된 현상의 극단에는 유튜브에서 인기인 일명 '리액션 영상'이 있다.
본인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닌 다른 사람이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거나 더 나아가 제3자가 이를 지켜보며 내뱉는 리액션을 본다. 본인이 축구 경기를 직접 관람하지 않고,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담긴 영상을 본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두고 "리액션 영상은 경험 표절의 한 형태"라며 "그 영상을 보면서 화면 속의 사람들과 함께 그 순간에 거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연애마저도 간접 경험에 포위당하기 시작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022년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가상 캐릭터와 비공식적으로 결혼한 수천 명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얼마 전 국내 방송의 한 다큐멘터리에는 챗 GPT와 연애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관계가 정서적으로 만족스러우며 진짜 사람과의 관계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직접 경험의 빈곤' 대가는
아이들은 이제 자연, 놀이, 음악, 언어에 대한 첫 경험을 스크린과 같은 기술을 통해 접한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온라인 아이디와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만든다. 반면 대면 상호작용의 기회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뒤덮여 살지만 사회적 기술(예의범절, 인내, 눈 맞춤)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줄서기나 길을 헤매는 것과 같은 물리적 현실이 가진 한계를 참지 못한다.
편안함을 추구한 대가는 무엇일까. 인간은 서로를 보며 소통하도록 설계됐다. 표정, 자세, 몸짓을 읽을 수 있게 진화했다는 말이다. 강렬한 눈맞춤은 심박수를 높이고,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게 한다. 대면 소통은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더 잘 감지하는 방법이며 공감 능력과도 직결된다. 대면 상호 작용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생물학적 능력도 결국 사라질 수 있다고 저자는 우려한다.
국내 대표 여행 유튜버인 '곽튜브' 채널. 유튜브 캡처
책엔 2010년 한국에서 한 부부가 온라인 게임 프리우스에서 가상 캐릭터를 딸처럼 키우느라 실제 아이는 굶어 죽게 내버려둔 사례가 등장한다. 클릭 몇 번으로 아이에게 밥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는 아이를 달래줄 순 없다. 많은 기술이 대면 대화의 어색함과 신체적인 한계 같은 것들을 '마찰 없이(frictionless·마크 주커버그가 즐겨 쓰는 표현)' 만드는 데 집중한다. 애플 광고는 "자동적이고 수월하며 매끄러운" 경험을 내세운다. 하지만 고통과 실패, 땀으로 얼룩진 현실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딱 떨어지지 않는 경험의 조각들"이다.
사람들이 온종일 온라인 세상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데 몰두하는 시대다. 기술이 인간을 확장하는 게 맞는지, 기술이 인간다움을 대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경험의 멸종·크리스틴 로젠 지음·이영래 옮김·어크로스 발행·364쪽·1만9,800원